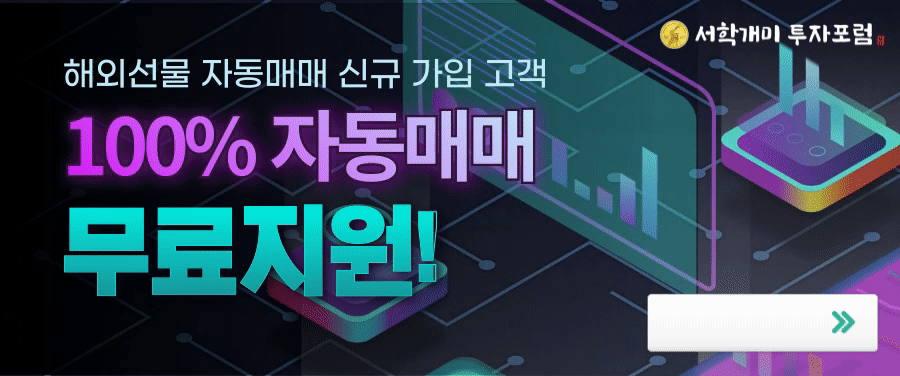시리아,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 부활의 기로에 서다

시리아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재편 성격을 띠며 국제사회로 다시 발돋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년간 지속된 시리아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시리아의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이후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리아의 경제 재건에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여전히 정세 불안과 경제난, 난민 문제와 같은 심각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시리아의 국토는 한국의 1.85배에 달하지만, 인구 수는 한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4.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동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시리아는 러시아, 이란, 미국, 이스라엘 등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편,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얼룩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로는 정권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국제사회에서 대리전 양상을 띤 바 있다.
최근 알샤라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전복시킨 후, 미국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모습은 국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회담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로 묘사하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한국이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 배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비밀 방문 이후, 한국은 191개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수교하지 않았던 시리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회복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시작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 간의 관례적인 적대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외교적 시도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붕괴와 파괴는 국가의 GDP를 전쟁 이전 대비 20% 이하로 끌어내렸으며, 유엔 보고에 따르면 인구의 90%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전력 공급이 평균 하루 2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시리아의 오랜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제재 해제가 시리아 경제 재건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부패한 정권 체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 난민의 송환을 서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복원되면서 일부 유럽 국가는 시리아를 난민 송환이 가능한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대규모 귀환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시리아는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적, 경제적 재건의 기로에 서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여러 번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시리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