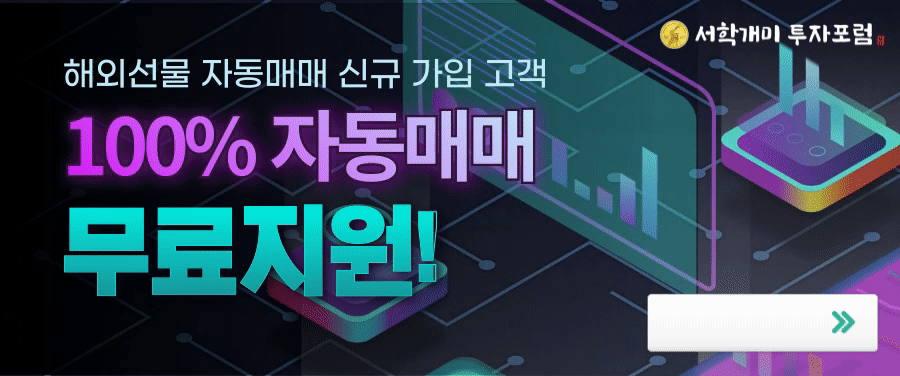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신뢰의 차이에 대한 고찰

디지털 화폐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JP모건,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예금토큰(Deposit Token)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예금을 토큰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다. 이 같은 반응은 단순한 기술적 우려를 넘어서, 신뢰의 구조에 대한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자산 기반의 화폐로, 테더(USDT)는 보유 자산의 80~90%를 미국 국채로 구성하며, 서클의 USDC 또한 현금과 단기 국채, 머니 마켓 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은행의 지급 약속을 믿기보다는 실물 자산 자체를 디지털 형식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디지털화된 무위험 자산, 즉 ‘토큰화된 달러 국채’라 할 수 있다.
반면, 예금토큰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의 부채를 토큰화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은행의 지급능력, 신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 은행이 보유한 상업대출, 부동산 자산, 파생상품 등은 유동성과 가치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서, 신뢰의 구조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사용자는 “누가 발행했는가”보다 “무엇으로 담보되어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점차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의 신용보다 실물 자산 기반의 토큰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상황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도 ‘토큰 증권(STO)’ 및 예금 기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내부 결제 망과 유동성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폐쇄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어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테더(USDT)를 송금하고 보관하는 일이 흔해졌고, 이는 국내 규제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 정부는 원화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 우려와 환투기 등의 이유로 인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국민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디지털 원화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성과 제도 내 통제를 내세우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예금토큰은 금융기관 간 유동성 정산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일반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화 시스템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GENIUS 법안’은 비은행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준수 형태로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테더는 미국 국채 보유량 기준으로 세계 국가 중 5위에 오르며 글로벌 달러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구조적 변화에 한국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논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고 이 신뢰는 ‘누가 발행했는가’보다 ‘무엇